
[이코리아]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공유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심지어 창업스쿨에서 '공유경제창업' 과정이 신설될 정도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이 처음 사용하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숙박, 차량, 옷, 유아용품, 여행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업체들이 공유경제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서울시,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유경제 카드를 내세워 카셰어링, 공공기관 회의실 공유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워크 스마트 포럼에서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공유는 정부3.0이 지향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이번 포럼이 정부와 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공유경제, 합법과 불법 사이
하지만 막상 공유경제 사업모델을 가진 업체가 시장에 진출하면 환영보단 기존 업계를 침범하고 위협한다는 반발과 함께 불법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지난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차량공유 업체 '우버(UBER)'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과 차량이동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준다.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누적이용객 10억명을 돌파했고 기업가치도 지난해 말 기준 680억 달러(약 81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진출한 한국에선 불법 택시영업 논란이 일면서 결국 영업이 중단됐다. 지난 2014년 12월에는 서울지방검찰청이 우버의 최고경영자인 트래비스 칼라닉 씨를 비롯한 관계자와 법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실시간 매칭 카풀 서비스도 불법 논란을 겪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가 앱을 통해 목적지가 일치하는 자가용 차량 소유주(드라이버)와 고객(탑승자)을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과 IT기술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면 불법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으로 제2의 우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약 300억 달러(33조원)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공유숙박 업체 '에어비앤비(airbnb)'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숙박업계의 반발과 함께 불법논란이 일면서 여전히 그 꼬리표를 벗어나진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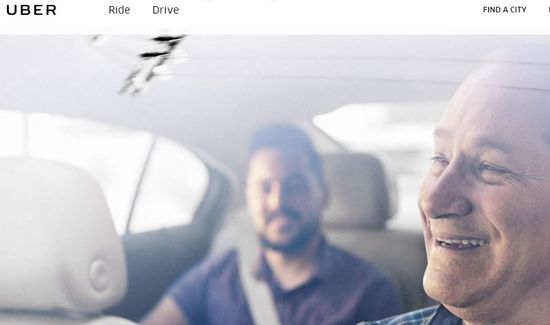
◇ 한국판 '우버·에어비앤비' 나오려면…
이들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한국판 '우버·에어비앤비'가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공유경제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면 규제당국과 공유경제 업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5일 LG경제연구원은 "규제당국은 기존 규제의 근거나 정당성을 정책 판단의 전제로 삼는 방어적 접근보다는 소비자를 비롯한 경제전체의 순 후생수준에 대한 기여, 새로운 실험과 혁신, 경쟁과 협력을 촉진해 경제전체의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 업체의 경우에는 안전과 프라이버시 등 규제당국의 문제 제기가 합법적이라면 당국과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책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는 일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공유 비즈니스가 창출하는 구체적 효과(소비자 후생, 공동체에 대한 기여 등)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규제당국과 공유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