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제가 2013년 첫 시행 후 올해로 7년째를 맞았으나 규정 미비로 반려견이 안락사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의 주인을 쉽게 확인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반려견에게 동물등록 생체칩을 이식했음에도 안락사를 당한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안락사된 반려견의 주인인 A씨는 SNS를 통해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초기, 생체칩 시술을 한 강아지를 얼마 전 안락사로 보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생체칩이 있는 아이인데도 연락이 없어 누군가 데려가서 키우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보았다가 너무나 큰 슬픔과 마주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안락사를 시행한) 해당 협회에서는 목뒤만 스캔했고 칩은 나오지 않아 안락사했다고만 합니다. 심지어 2019년 6월 정보까지 새로 업데이트한 아이였는데 허망하게 떠나보냈습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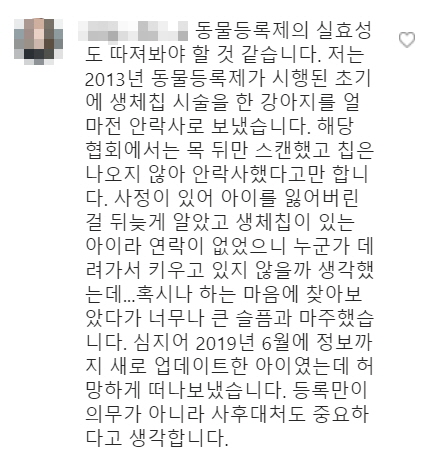
동물등록 방식 중 하나인 무선 전자 식별 내장형은 생체칩 형태로 리더기로 동물 몸체를 훑었을 때 인식이 되는 방식이다. 규정상 생체칩은 동물의 양 어깨 사이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칩이 지방층에 들어가서 체내 이동 가능성이 있다. A씨는 동물협회가 반려견의 목 뒤만 스캔하고 칩이 발견되지 않아 안락사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동물협회 주장은 다르다. 동물 협회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인식칩의 이동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많이 움직이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동물인식칩 검사는 보호소에 들어왔을 때와 안락사 시행 전 등 다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생체칩의 인식이 안된 이유로 두 가지 경우가 예측 가능하다. 애초에 칩이 없었거나 칩이 훼손됐거나이다. 해당 견주는 2013년 칩을 심으셨다고 했으니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견주는 안락사된 반려견의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했으나, 이는 생체칩이 훼손돼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생체칩 상태 점검은 모두 견주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알려지지 않았으니 훼손돼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농림축산부의 허술한 일처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코리아> 취재 결과, 농림축산부는 생체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생체칩 인식 가능 여부 확인은 견주가 직접 병원 등을 방문해야 알 수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아직 생체칩 주기적 관리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동물)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도 없는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년 단위로 생체칩의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유자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도 있어 어떻게 적용할지 충분히 상의 후 동물복지종합계획과 함께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안락사 사건의 핵심은 생체 칩 훼손 사실을 견주가 몰랐고, 그 사이 반려견이 안락사당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부가 생체칩이 훼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처리를 했다면 안락사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견주 역시 생체칩을 이식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생체칩이 훼손될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한다.
